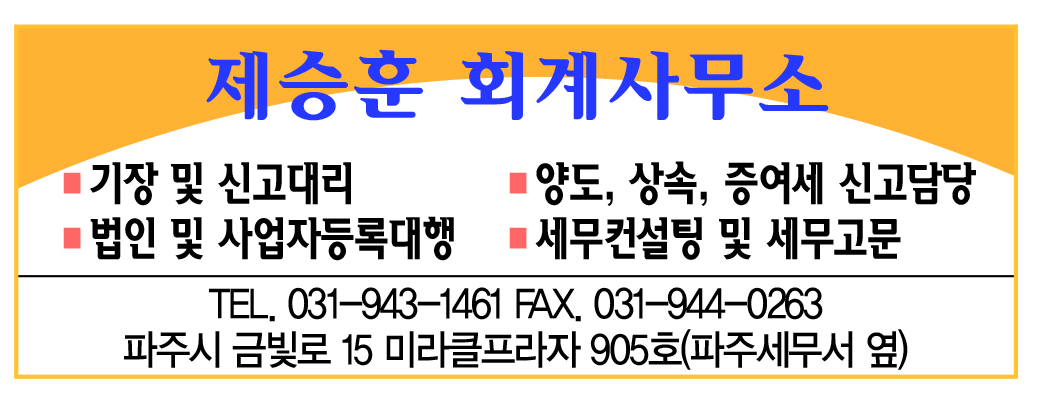<특별기고>-박미희의 김치 생각
입력 : 2022-02-19 19:39:05
수정 : 2022-02-19 19:39:05
수정 : 2022-02-19 19:39:05

내 딸들은 시었다며 못먹겠지만 이 맘 때면 생각나는 김치가 있다.
코끝이 에이는 추위는 이제 끝났나 싶다가도, 훈훈해진 햇살에 이만 코트를 벗자 싶다가도, 하루 밤 사이 기온이 똑 떨어지는 이맘 때. 떠나는 겨울이 아쉬워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 같은 꼭 이맘 때, 나에겐 생각나는 김치가 있다.
가을에 담가두었던 시금시금한 무우 김치. 겨우내 폭삭 익어 군내가 살짝 나는 김장 김치를 꺼내 물에 헹구어 담가둔다. 거기에 된장 조금, 멸치 몇 개를 넣고 지져낸다. 비싸고 좋은 양념이 들어가거나 별다른 조리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.
그러나 생각하면 입안에 군침이 돈다. 이 새금한 맛이 내게는 겨울과 봄 사이 최고의 미식이다. 아마도 내 나이 또래면 누구라도 경험해봄직하다. 내 딸들은 아마, 너무 시었다며 몇 젓가락 못 먹을테지.
요즘 사람들은 버리고 말, 다 쉰 김치를, 내 어머니는 겨울의 끝자락마다 참 맛있게도 지져주셨다. 어머니는 손 맛을 타고 났던 걸까. 아니면 없는 살림, 새끼들에게 한 입이라도 맛있는 걸 먹이느라 없던 손맛도 좋아진 걸까. 어쨌거나 어머니가 지져주시는 그 시금한 김치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줄 알고 참 맛있게도 먹었다.
나 어렸을 때, 국민학교 4학년 무렵이나 됐을까. 돌아보면 쪼그만게 무얼 안다고, 어른들을 따라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던 그시절. 나는 그때도 욕심이 많아 온 산을 종종 거리며 쓸 만한 땔감들을 잔뜩 그러모았다.
내 몸뚱이만큼 많은 나무들을 이고 지며, 내 조막만한 가슴은 이걸 보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에 부풀어오르곤 했다. 산을 내려올 때면, 잔가지 하나라도 떨어질까 얼마나 조바심이 났는지.
그러다가도 어른들이, 미희야, 너희 엄마 왔다!
하면 나는 그 산을, 그 높은 산을 한달음에 내쳐 달려갔다. 그 때 만큼은 해온 나무를 떨어뜨리고, 비탈에 떼굴떼굴 굴러도 힘든 줄 몰랐다. 내가 나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몰랐다. 그저 마중 나온 엄마가 보고 싶어 제일 먼저 뛰어가던 그 때. 엄마를 생각하면, 나는 항상 그 순간이 떠오른다.
나는 엄마의 손맛으로 김치를 담가, 그걸로 먹고 산다. 나보다 젊어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유산으로, 참 잘 먹고 산다.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,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갈빗대를 몇개 골라 새벽부터 찜을 찌기도 한다.
색색이 고운 채소들을 먹기 좋게 잘라 샐러드도 만든다. 어느 먼 나라에서 비싸게 판다는 오일도 두르고, 가끔은 혼자 이름 모를 와인을 따며 기분을 낸다. 세상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이 널려있는지 모른다.
이제 어머니보다 나이 들어, 나는 가끔씩 젊은 어머니를 생각한다. 없던 시절, 삭은 김치를 지져서라도 자식들에게 맛난 것을 먹이고 싶었던 내 어머니. 이토록 좋은 세상, 이토록 멋진 식사 한 번 못하시고 간 내 어머니.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, 사람들은 세상의 좋음을 얼마나 느끼고 살까. 나는 그게 참 궁금하다.
오늘 밤은 바람이 차다. 새근한 김치를 지져먹어야겠다. 바람이 들지 못하게 옷깃을 여민다.